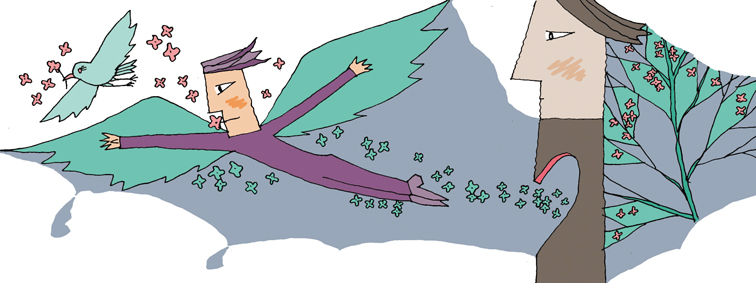
동네에 있던 가게들이 재개발 때문에 모두 사라졌지만, 한때 난 만화와 비디오 가게의 성실한 단골이었다. 신작에 집착하는 편도 아니었고 웬만하면 제때 가져다 줬다. 가끔 연체도 했지만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였고 연체금도 바로 갚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모르는 나의 취향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게도 나름 나만의 ‘취향’이란 게 있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과 안면을 익힌 후부터는 가끔 ‘추천’이란 것을 받기도 했는데 그 ‘추천’이란 게 딱히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추천 해주는 입장에선 어쩐지 늘 자신감이 넘쳤다. 타이틀이나 대강의 줄거리만 봐도 딱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건, 그들의 그 자신감 넘치는 자세 때문이었다. 종종 거절도 못하고, “아, 예.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하며 애초 빌리려 했던 것과 함께 (억지로) 가져가기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가져가서 보면, 역시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비디오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내게 추천해준 비디오는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알 수 없는,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 컬트영화였다. 난 이렇게 난해하고 지루한 컬트영화는 절대 보지 않는데, 왜 그런 걸 내가 좋아할 거라 여겼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만화방 아줌마가 내게 빌려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안 빌려줬다는 만화를 읽고는, “꺅~! 전 이렇게 저질스런 내용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물론 다소 유치한 농담과 설정이 오가는 만화를 즐겨 빌려봤지만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만화를 반납하러 갔을 때 아줌마는 왜 그 다음 회 만화를 빌려가지 않는지 무척 의아해했다.
누군가의 취향을 정확히 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젠가 오랜 친구와 길거리를 가다가 쇼윈도에 진열돼 있는 옷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야, 딱 네 스타일이다.”
친구는 ‘지금 날 놀리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비죽거렸다.
“난 저런 유치한 핑크는 좋아하지 않아.”
친구는 ‘유치한’을 특히 강조했다. 평소 친구가 즐겨 입는 색이었다. 디자인도 비슷하다고 여겼는데 친구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모양이었다.
사실 누군가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꼭 들어맞게 권해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주는 추천이 기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해답은 결국 나 자신
그런데 가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의 조언에 너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조금씩은 다 어긋나 있기 마련이다.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권유가 너무나 그럴 듯 해보이고 논리적으로 느껴져서 내 마음에 있던 작은 어긋남을 무시하고 따랐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전혀 다른 작은 어긋남. 어찌 보면 마음에 있는 그 작은 어긋남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루는 전부가 아닌가 싶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 다르게 제시해주는 이야기에 헷갈려 하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일단은 내 마음 속의 이야길 고요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취향,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다른, 나만의 온전한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의 문제도, 조금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배지영
2006년 <동아일보>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란씨"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오란씨>(민음사)와 장편소설<링컨타운카 베이비>(뿔)가 있다.

